|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오블완
- 미시령 성인대
- #윤두서 자화상 #공재 윤두서 자화상 #공재 자화상
- #붕당의 발생 #붕당의 형성 #붕당의 시작
- #평화누리길 2코스 #평화누리길 1코스 #평화누리길 1~2코스
- 해파랑길 48코스
- 해파랑길 20코스
- 단양 구담봉
- 평화누리길 7코스
- #북한산 문수봉 #북한산 승가봉 능선
- 앙코르와트
- #강화나들길 3코스
- 티스토리챌린지
- 정서진 #정서진 라이딩
- #강화 나들길 18코스 #강화 나들길 18코스 왕골 공예마을 가는 길
- #조선 중기 정치와 정책(인조~현종 시기)
- 명동 성당 미사
- #대흥사 #해남 대흥사
- 지족불욕 지지불태 가이장구(知足不辱 知止不殆 可以長久)
- 평화누리길 3코스
- 해파랑길 8코스
- #건봉사 #고성 건봉사
- 평화누리길 4코스
- 평화누리길 경기 구간 완주
- 북한산 만포면옥
- 성인대
- #조선 국왕의 일생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엮음 글항아리
- 김포 한재당
- 김포 문수산
- 군위 팔공산
- Today
- Total
노래하는 사람
흙속에 저 바람속에 이어령 문학사상 2002년 초판 1쇄, 2010 2판 4쇄 290쪽 ~04.30 본문
책 표지에 한국 최초의 한국인론이라고 쓰인 대로 한국인의 특성을 잘 분석한 책이다.
하지만 이 글이 쓰인 시기와 현재와의 괴리감이 상당히 크다.
이 글들이 1962년에 경향신문에 연재되었으니 지금의 우리 나라와는 사정이 많이 다르지만 우리 민족의 슬픔과 자조, 고통들은 이해할 수 있다.
내 독후감을 찾아보니 저자의 책은 12권을 읽었다.
거시기 머시기,
언어로 세운 집,
이어령의 삼국유사 이야기,
디지로그,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디지로그 선언,
소나무,
느껴야 움직인다,
빵만으로는 살 수없다,
이어령 문화코드,
우물을 파는 사람
지성에서 영성으로
저자는 2022년 89세에 별세했다.
그러니까 이 책의 글들을 쓰고 60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자의 책들이 더 좋아졌다는 생각이 든다.
천재들은 대체로 성실하지 않거나 노력을 등한시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저자는 끊임없이 노력한 성실한 천재였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체할 수 없어하는 노인이었다는 생각도 든다.
88 올림픽때 굴렁쇠 굴리던 소년도 그의 아이디어이고 수많은 창조적인 작업들을 했다.
딸이 먼저 죽고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그의 '지성에서 영성으로'같은 책에서 저자의 신앙관도 볼 수 있었다.
이 책의 '풀이름.꽃이름'에는 우리 민족이 하도 힘들고 어렵게 살다보니 꽃이름도 쓰레기같은 이름이 많다고 한다.
며느리밑씻개, 며느리배꼽, 여우오줌, 쥐오줌풀, 코딱지나물, 개불알꽃, 홀아비x등 입에 담기에도 망측한 이름들이 많다.
달맞이꽃을 우리 토속적인 이름으로는 도둑놈꽃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음료 문화론에서는 한국의 숭늉 맛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숭늉에는 은은한 온돌의 장판색 같은 색깔이 있고 역시 그렇게 구수한 맛이 있다.
그러나 그 빛깔은 있는 듯 하면서도 없는 것 같고 그 맛은 없는 듯 하면서도 있는 것 같아 마시고 나야 비로소 그 맛을 알 수 있으며 따라 놓고 봐야 그 빛깔을 볼 수가 있다.
잡힐 듯 말듯한 여운이 입술 위에서 싱그럽다.
그러한 숭늉 속에는 무뚝뚝하고도 정에 겨 운 할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있고 외할머니 같은 손길이 있고 우륵이 타는 가야금 소리가 있고 춘향의 옷자락 같은 음향이 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숭늉의 그 미지근한 감촉이야말로 한국인의 체온이다.
유교의 중용성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우리는 맑은 물에는 고기가 꾀지 않는다 해서 대체로 너무 맑고 투명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지나친 결백이나 또 무엇을 꼬치꼬치 따지는 것을 싫어한다.
약간 혼탁한 것 약간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는데 한국인의 기질이 있다. 일본인들만 해도 아싸리 한 것을 좋아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보다 좀 뿌옇고 그늘진 것을 좋아한다.
어렴풋한 것, 수수한 것, 딱 부러지게 쪼갤 수 없는 그런 정감을 좋아한다.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듯 마는 듯, 우는 듯 웃는 듯,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다.
화투는 6세기 말 서구의 카드에서 힌트를 받아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전한다. 그러나 악마의 그림책에도 지적되어 있다시피 서구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그것은 일본의 독창적인 카드 놀이라는 것이다.
1년 열 두 달로 나눠진 화투는 계절에 맞추어 자연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1월 송죽, 2월 매조, 3월 사쿠라 하는 식으로 시작해서 8월에 공산이며 9월에 국화며 시월의 단풍이며 모두가 자연의 풍류 얽혀 있는 것들이다.
배일사상이 짙은 한국인은 바로 이웃이지만 일본풍속은 여간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유독 화투만이 하나 예외로 일본인보다 더 그것을 즐겨했고 대중화한 데에는 그와 같은 풍류의 정이 우리 구미에 맞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화조월풍을 사랑한 우리의 고유한 감정과 화투의 그것은 서로 공통되는 요소가 많다. 매화도 국화도 난초도 단풍도 모두 우리가 철마다 즐겨 노래 불러오던 초목이요 꽃들이다.
말하자면 화투는 일본에서 건너 온 곳이지만 오히려 우리의 감정과 호흡에 일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화투와는 다르다.
화투가 자연의식을 반영한 카드라고 한다면 트럼프는 강렬한 인간의식과 사회 의식을 상징한 카드라고 볼 수 있다.
서양에서는 무지개가 시의 소재로 나타난 것이 워즈워스 때의 일이며 그림에 자연 풍경이 등장하게 된 것은 밀레 때부터 했던 것이다.
그들은 줄곧 인간만을 그렸다.
그것이 예수든 천사든 조콘다 부인의 신비한 미소든 그들이 모색했던 것은 인간 속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움이었다. 자연이란 인간의 배경에 불과한 것이었다. 우리(동양)는 정반대로 자연이 주요, 차라리 인간은 배경적인 것이었다.
그리스 항아리에는 목동이 그려져 있지만 한국의 도자기는 버드나무 아니면 새이다. 그들은 자연을 인간화했고 우리는 인간을 자연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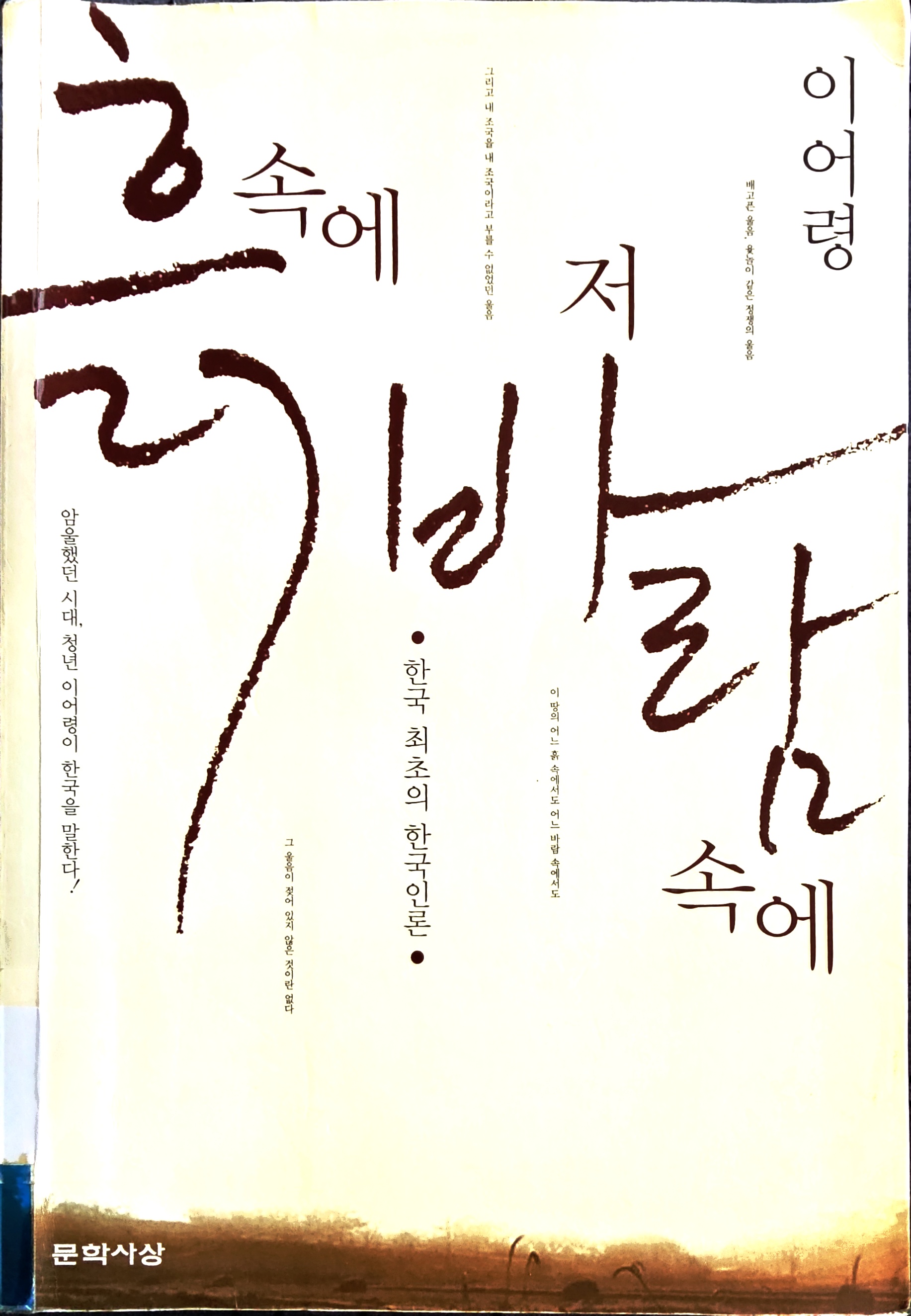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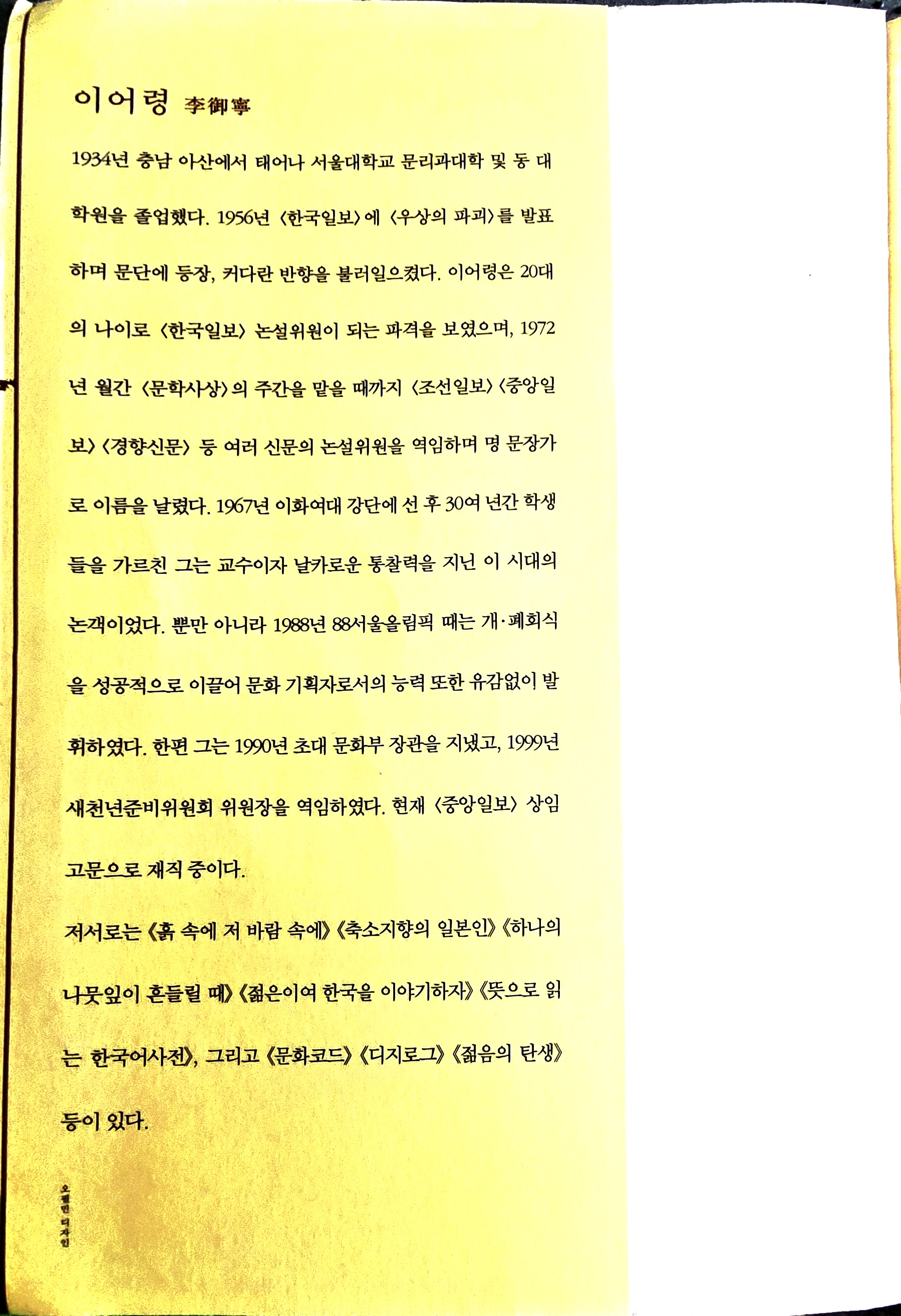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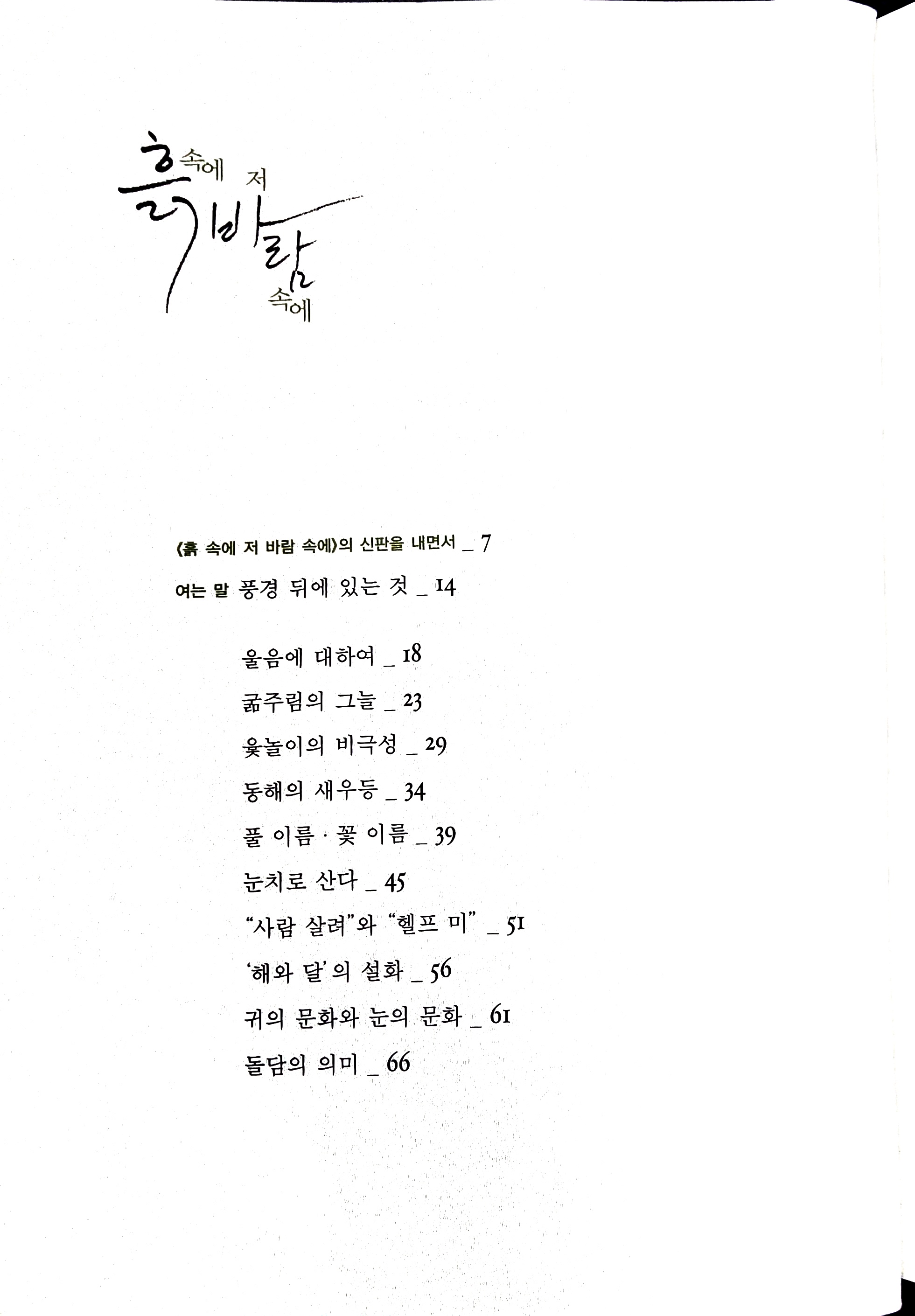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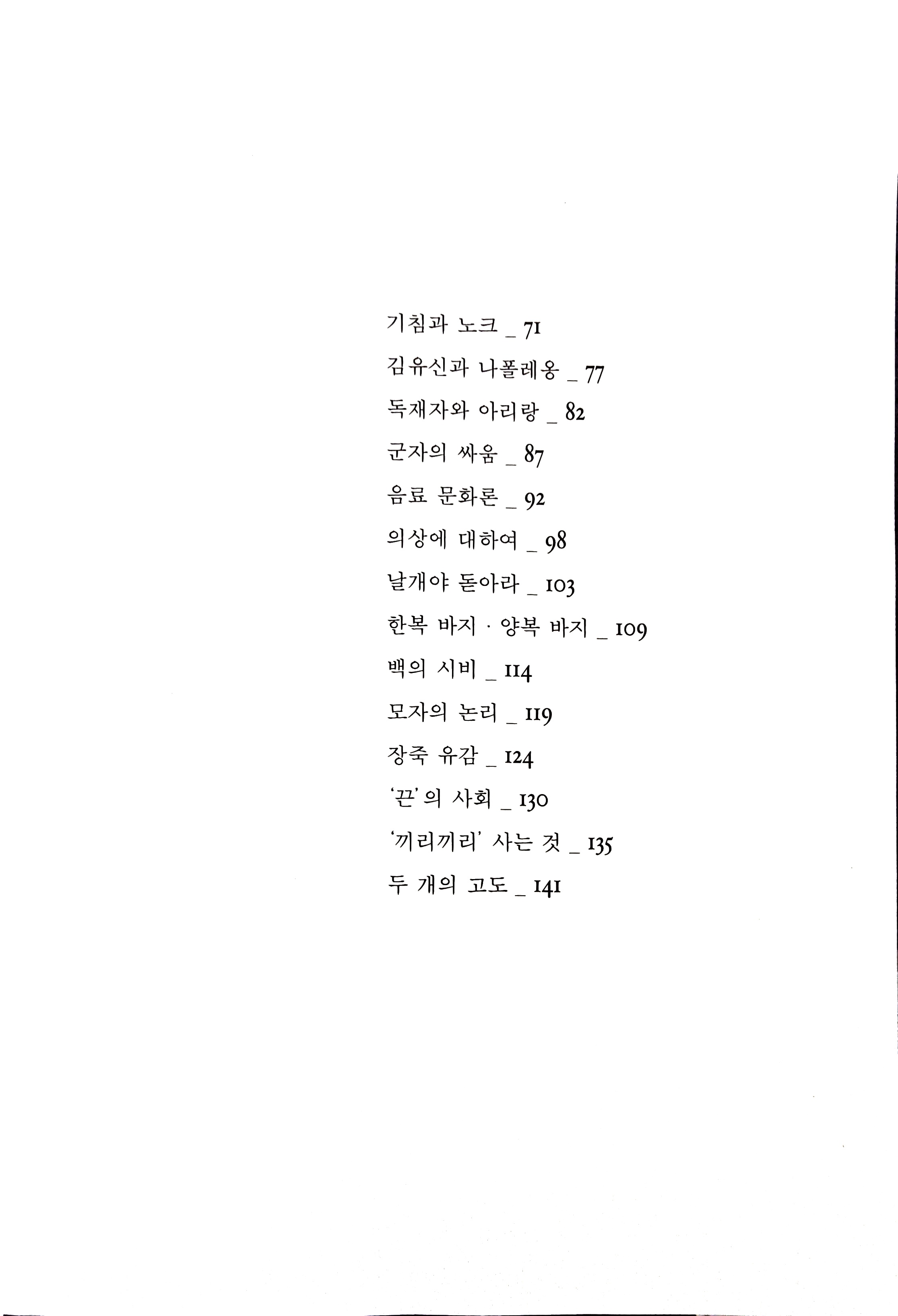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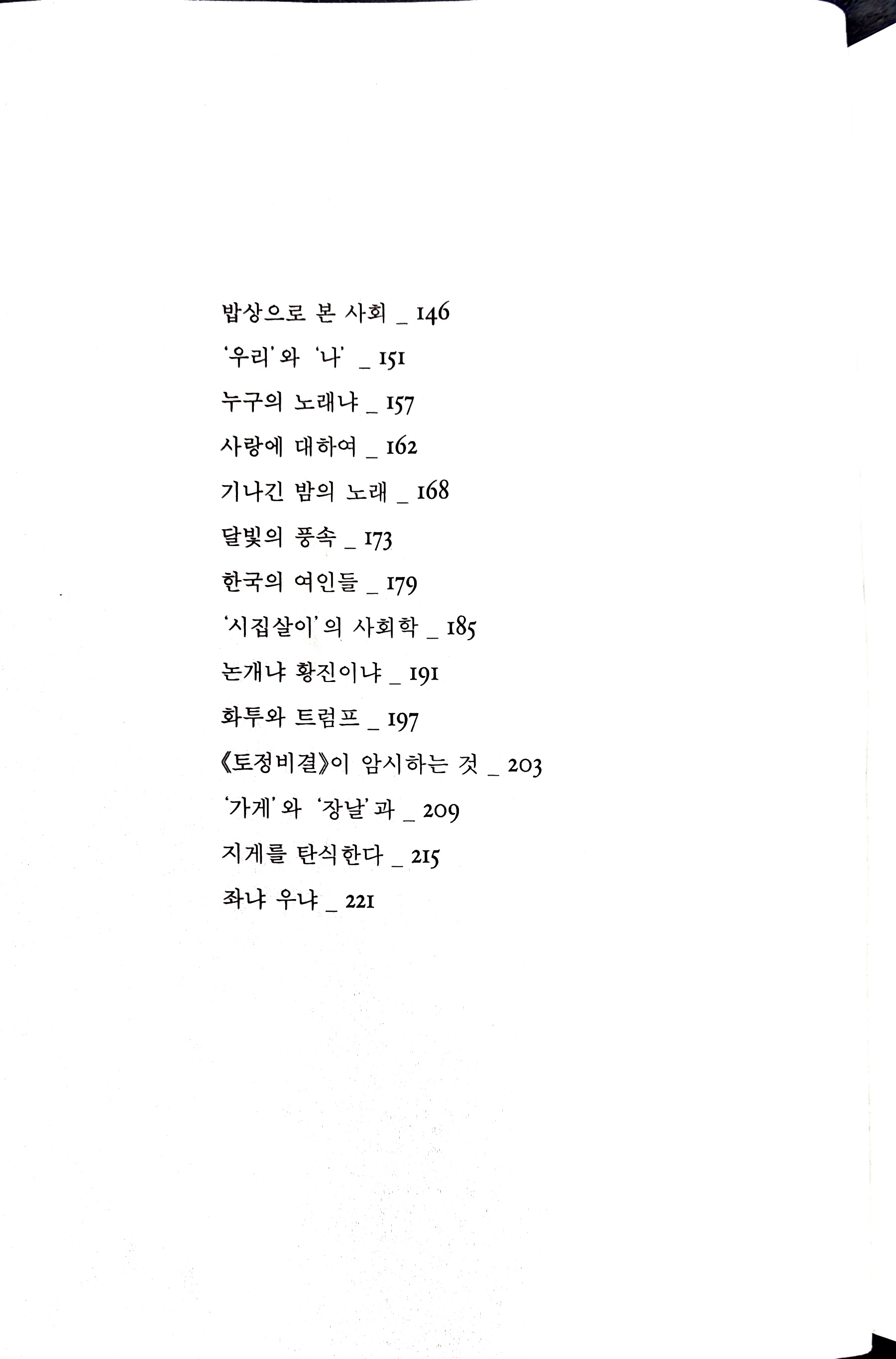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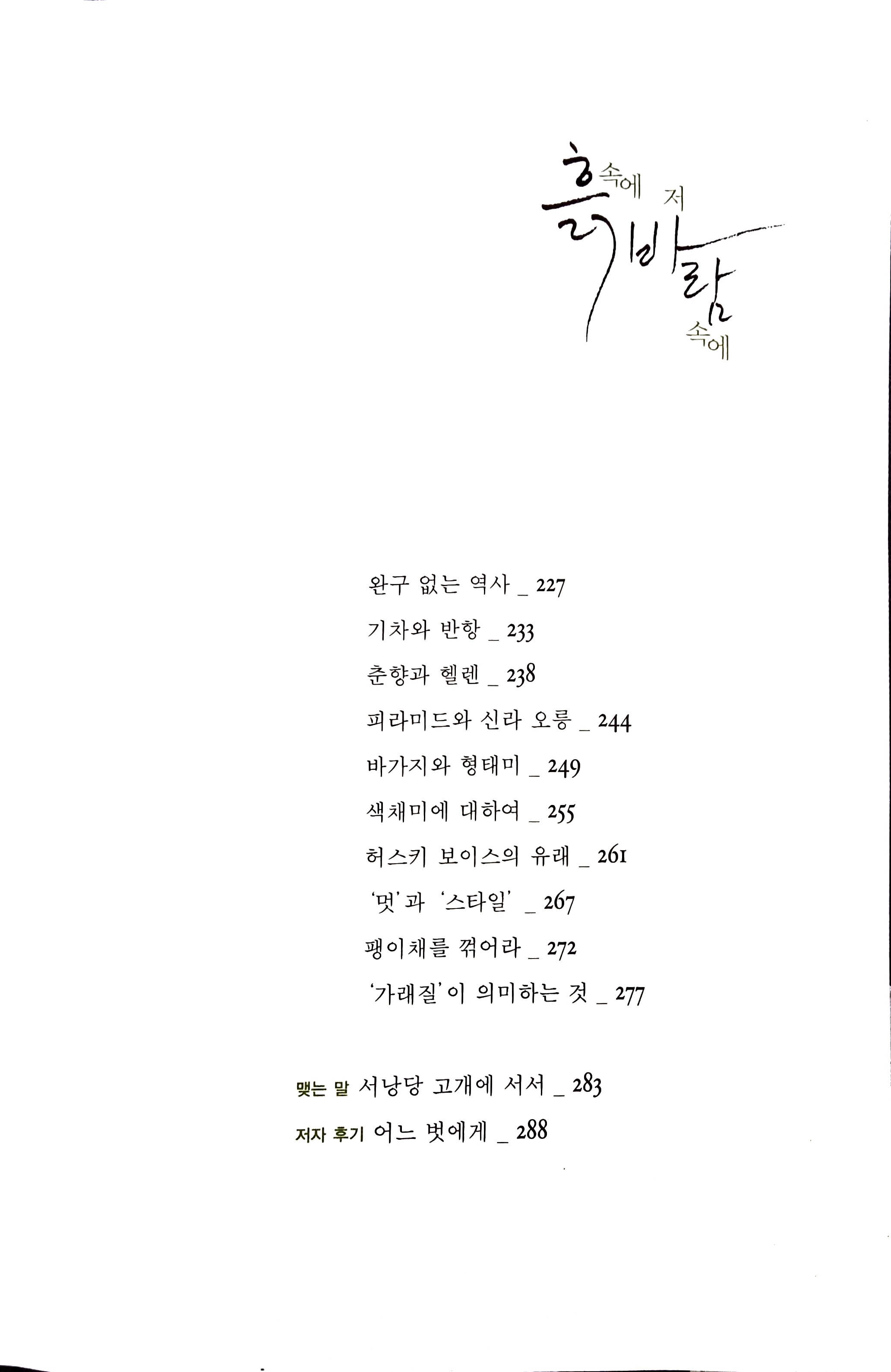
'독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어령 열림원 307 12/11~12/15 (0) | 2025.04.30 |
|---|---|
| 세상을 바꾼 경제학 야자와 사이언스 연구소 신은주 역 2013년 302쪽 ~04.28 (1) | 2025.04.29 |
| 정통 대한황손 이초남 안천 교육과학사 2018년 1판 6쇄 445쪽 ~4.22 (1) | 2025.04.22 |
| 아침형 인간 사이쇼 히로시 저 최현숙 역 한스미디어 2012년 1판 40쇄 204쪽 ~4.17 (0) | 2025.04.18 |
| 오직 독서뿐 정민 김영사 2013년 1판 9쇄 405쪽 ~4.17 (0) | 2025.04.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