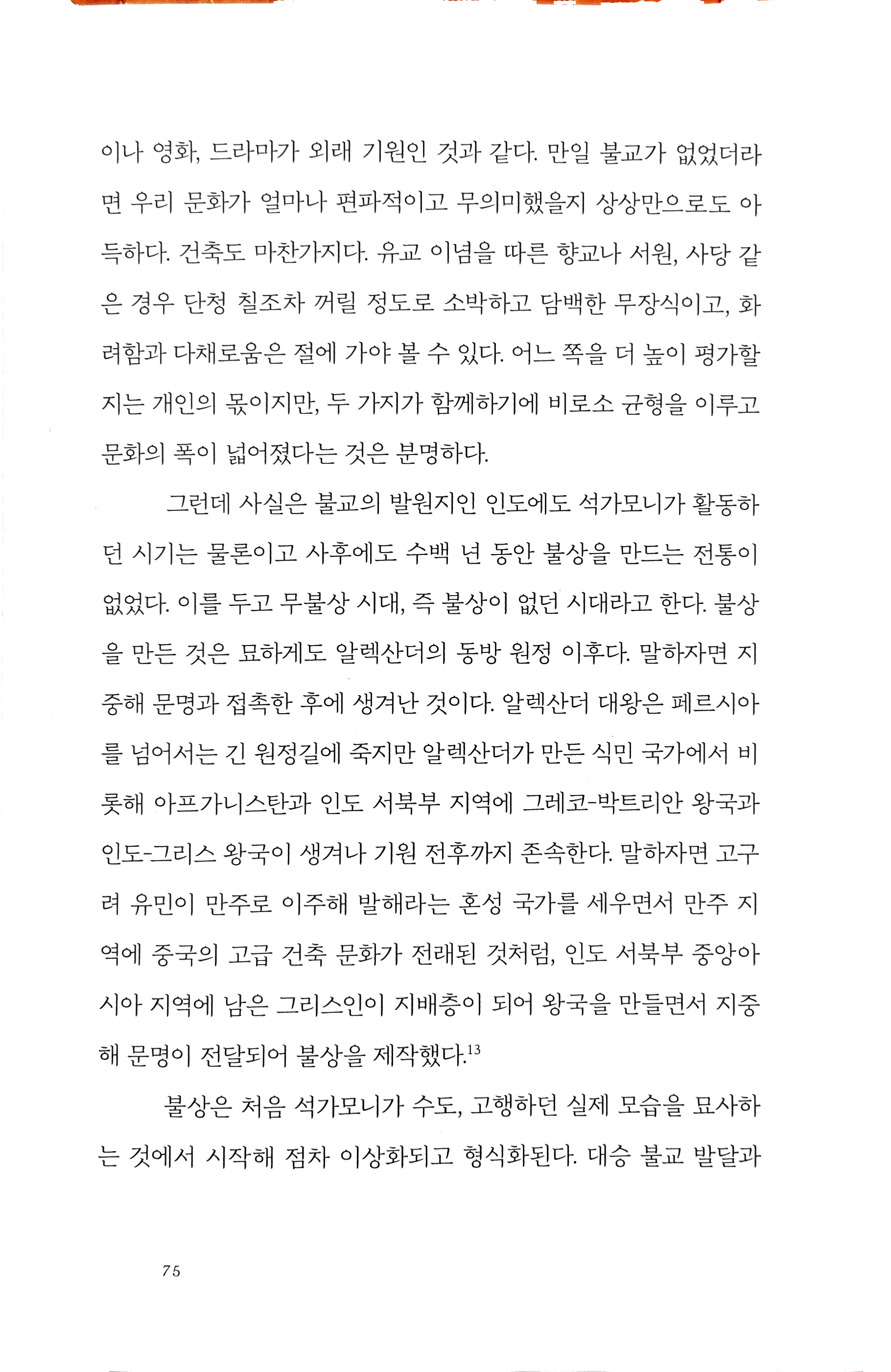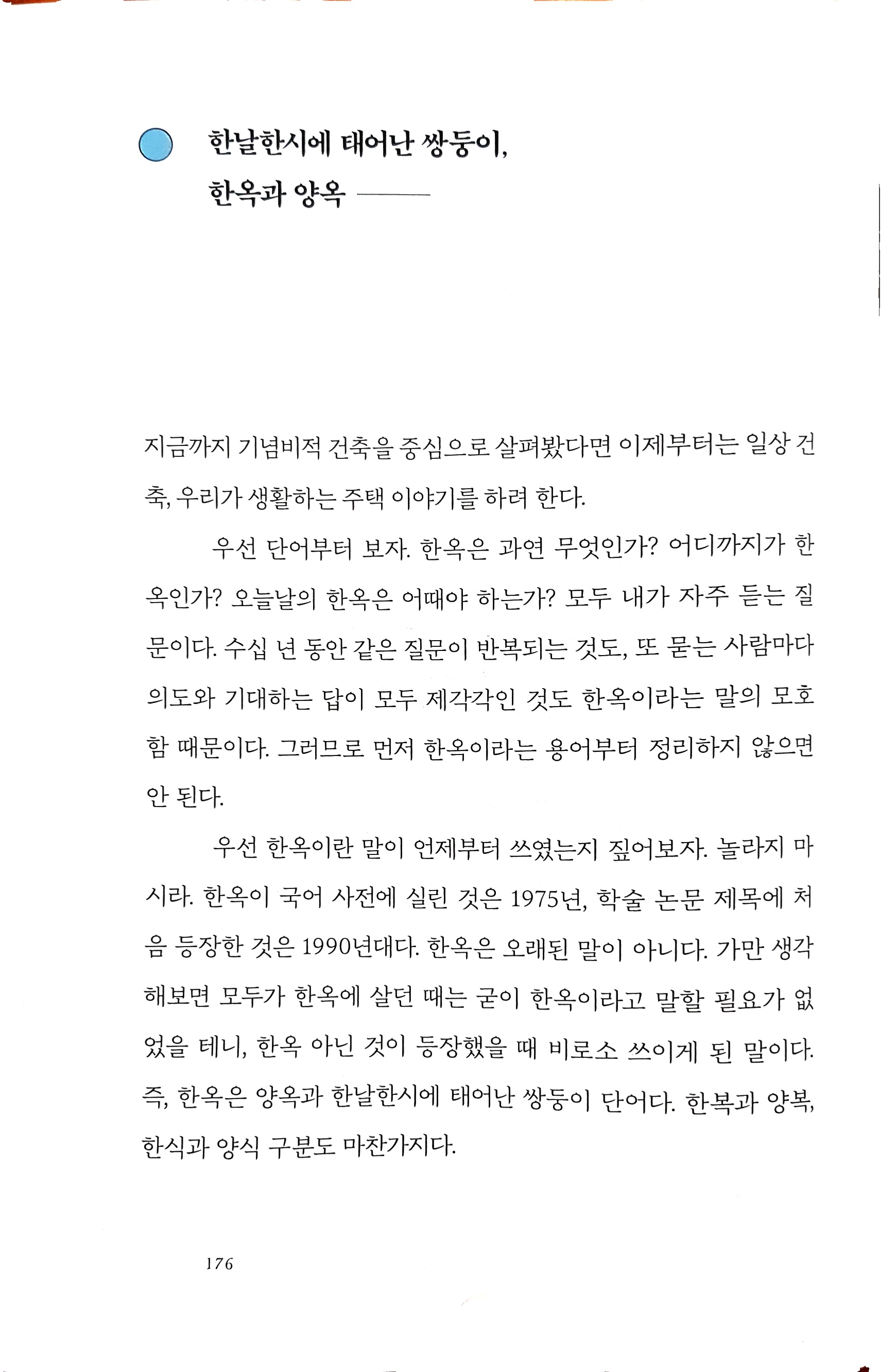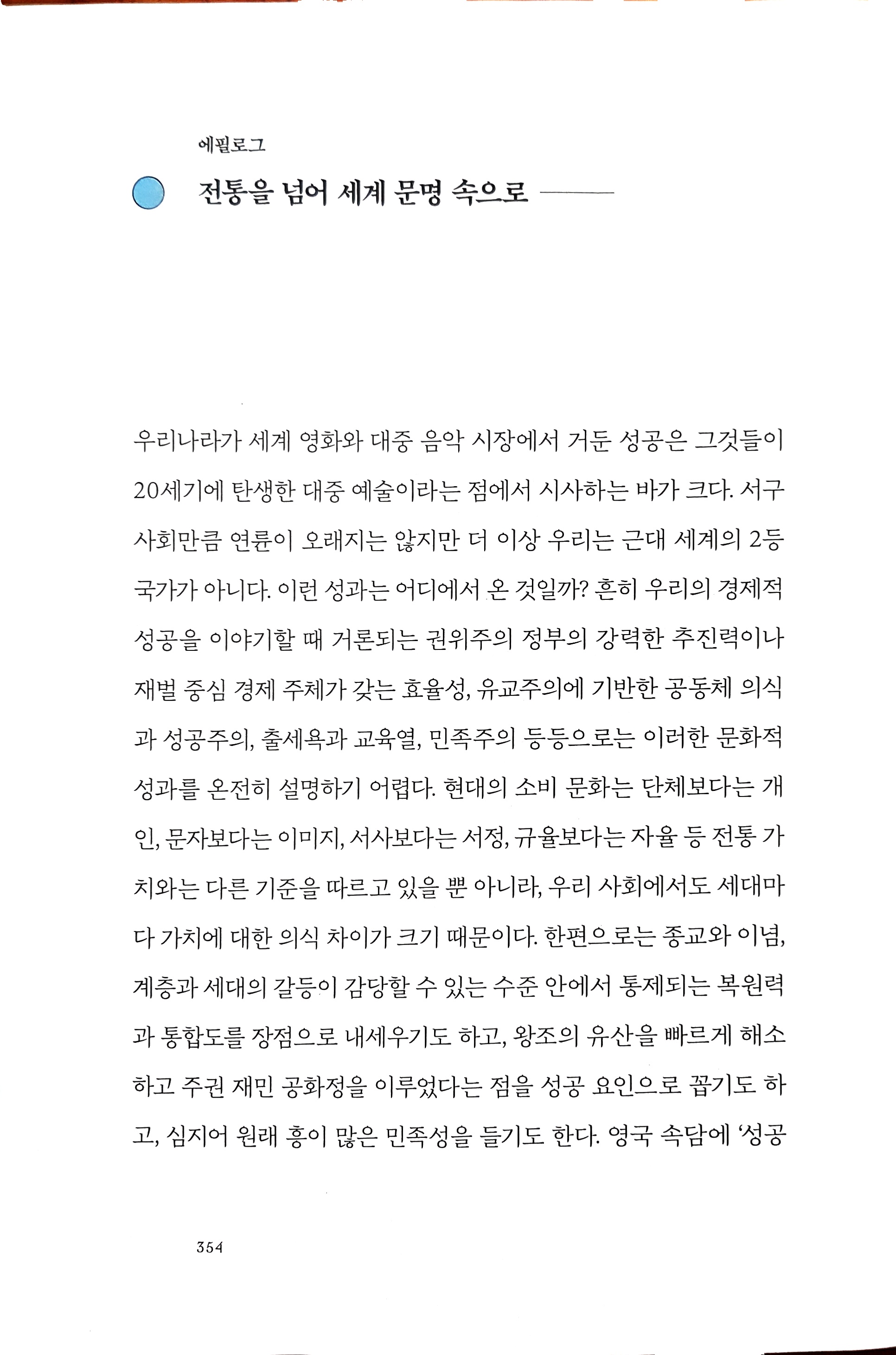한옥에 관한 관심 때문에 읽게 되었다.